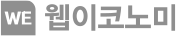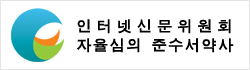[웹이코노미 박진 기자] 2018년 9월과 12월, 2019년 5월에 총 30만호의 3기 신도시 공급계획이 발표됐다.
30만호 공급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 3기 신도시 공급계획은 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이 변경되었음을 공개적으로 알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9.13정책 전까지 부동산 정책 중 공급정책의 골자는 ‘서울 정비사업 촉진 – 신도시 도입 억제’로 대표된다. 정책적 효과로 2016~2018년의 3년간 서울 주택가격 상승률은 2010년대 들어서 최대치에 이르렀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은 이 기조에서 180˚ 달라져 ‘서울 존치 – 신도시 도입 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
공급에서 수도권과 신도시 건설을 대거 천명한 것은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 주택가격 급등기에 내놓았던 처방과 유사하다. 다른점은 3기 신도시는 교통계획이 이미 디폴트로 깔려있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앞으로 달라질 수도권 부동산 공급정책에 따라 건설사별 명암이 엇갈리게 됐다. 특히, 15년만에 신도시 사업이 재개되면서 과거 2기 신도시 때 가장 수혜를 받았던 디벨로퍼들이 다시 한번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 도시의 통근·통학률
수도권 도시지역을 이해하는 하나의 유용한 툴이 ‘통근통학률’이다. 통근통학의 구성 중 서울시로의 통근통학율이 서울시와 경기도 도시간의 연계성을 표시하는 훌륭한 지표다. 예들들어 100가구가 통근통학을 하는데 2가구만 서울시로 통근통학한다면 이 곳은 연계성이 낮은 지역이다. 100가구 중 30가구 이상이 서울시로 통근통학한다면 연계성 높은 도시가 된다.
이번에 3기 신도시로 발표된 5개 도시지역은 고양시 창릉, 부천시 대장, 남양주시 왕숙, 인천시 계양, 하남시 교산지구의 5개 지역이다. 이들 5개 도시지역의 통근통학률은 인천 계양만 15%, 나머지는 30% 수준으로 경기도 도시 중 최상급 통근통학률을 보이고 있다. 즉, 시작부터 위성도시이자 수요분산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의미다.
2기 신도시들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2기 신도시 지역에도 GTX를 포함한 광역 철도노선이 건설될 예정이다. 중요한 점은 이를 통해 2기 신도시들의 서울 접근성이 높아진다. 서울 접근성은 물리적 거리에서 나오지 않고, 사람의 행태에서 나온다.
현재 경기권 도시들에서 서울시로 통근통학을 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서울과 연계성이 있는지 없는지 도시구조가 파악된다. 동탄1-2,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양주 옥정신도시나 파주운정신도시 등은 거리상, 위치상 제약에 따라 서울과의 접근성이 높지 못했다. 이 도시들이 GTX –A, C 등으로 연결되며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비중이 높아지면, 해당 도시의 수요층이 대폭 확대된다.
이런 변화로 3기 신도시만이 수도권 내 주택공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2기 신도시 중 서울 수요를 흡수하지 못했던 도시들도 동시에 서울생활권역에 포함되면서 실질적 주택공급 호 수는 대거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수도권 광역 개발의 시대와 함께 건설사 중 시행사들의 개발 계획들도 대거 사업화 단계에 진입할 것이 기대된다. 특히 GTX 전 노선을 훑다시피 한 HDC현대산업개발이 이런 변화에 가장 앞장서서 대응하고 있다. 태영건설과 대우건설, GS건설, 현대산업 등 대림산업을 제외한 사실상 전 건설사가 광역개발의 수혜를 보게 된다.
3기 신도시, 민간 디벨로퍼 '분주'
시가지 개발은 신규냐 기존 시가지 개발이냐로 개발 방식이 양분된다. 이 중 신도시 개발은 지자체·토지주가 중심인 도시개발사업과 정부위주의 택시개발 방식으로 양분된다.
택지개발사업방식은 1980년에 택지개발촉진법과 함께 시장에 파격적으로 등장했다. 정부가 민간 토지주로부터 강제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전면수용방식을 무기로, 80년대 스타일로 강제매입을 대거 진행하고 개발한 것이 현재의 택지개발신도시들인 1기 신도시를 포함하는 전국의 신도시들이다.
택지개발 신도시 사업은 등장과 함께 민간·지자체가 아기자기하게 만들어서 진행하는 형태와 달리 규모도 크고 속도도 빨라서 8~90년대 신도시 시대의 주인공이었다. 그러다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신도시 공급 중단에 따라 잠재적으로 소멸상태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이후에 민간·지자체 중심의 도시개발사업이 부상하게 된다.
도시개발사업에서 지자체는 주로 인허가 담당이며, 민간 사업자가 자금조달과 건설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택지개발신도시가 ‘수용’방식이어서 LH가 해당 토지를 수용으로 매입하고, 민간시행사들에게 토지를 입찰매각 하였다면 지금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지자체는 인허가만 전담하고, 민간 사업자들이 구조화금융을 통해서 토지 매입비용을 조달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본을 스스로 조달하는 시스템이 고착화되고 있다.박진 기자 webeconomy@naver.com
-
1

목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예향목포연구회, 목포시립무용단 정기공연 관람 통해 지역문화예술 이해 높여
-
2

"나무 기부부터 '돌봄'과 '상생' 가치 돋보여" KB국민카드, ESG 활동 전방위
-
3

IBK기업은행 1분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 8142억원
-
4

학교안전공제중앙회, 2025 한·일 학교안전 국제세미나 개최 및 교육종합박람회 참가
-
5

SK텔레콤,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간곡히 요청'..."해킹 피해 막을 수 있어"
-
6

국민체력100, 스포츠주간 맞이‘대국민 체력 증진 특별 프로그램’ 기획
-
7

[WE웹이코노미 사진뉴스] 꽃, 상상 그리고 향기를 품은 ‘2025고양국제꽃박람회’
-
8

삼성 16개 관계사, 26~27일 이틀간 삼성직무적성검사(GSAT) 실시
-
9

SKIET, 북미에 전기차 최대 30만대 분량 분리막 원단 공급
-
10

삼성SDS 1분기 잠정실적 매출 3조4898억원, 영업이익 268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