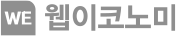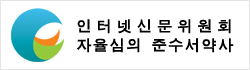[편집자 주] 우리는 여러 이유로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 구청 등 각종 공공기관을 찾는다. 이 때마다 민원 서식의 어려운 용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런 공문서를 포함한 공공언어는 '공공기관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언어'를 말한다. (사)국어문화원연합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어려운 공공언어로 인해 우리 국민이 치러야 하는 '시간 비용'을 계산해 봤더니 2021년 기준 연간 1952억원이란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는 2010년 연간 170억원에 비해 무려 11.5배 늘어난 것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웹이코노미는 '공공언어 바로 쓰기'를 주제로 시리즈 특집기사를 기획, 정부의 쉬운 우리말 쓰기 캠페인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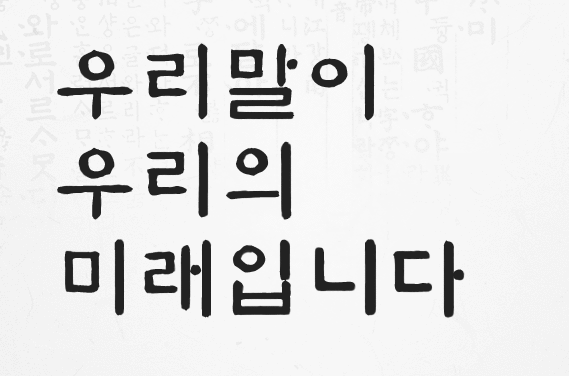
'비거노믹스(다듬을 말) - vegan economics(원어) - 채식 산업(다듬은 말)'
이는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다듬은 말' 메뉴의 전체 1만8087건의 '다듬은 말' 목록표에서 제일 위에 정리된 말이다. 국립국원은 '다듬은 말' 메뉴에서 1991년 순화자료집(1977~1991 종합)부터 2002년 순화자료집까지 21,000여 개의 순화어를 종합한 국어 순화 자료집 합본(2003년)과 2004년부터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에서 다듬은 말을 찾을 수 있다고 소개한다.
'다듬은 말' 목록표에서 1번으로 '다듬은 말'은 '(...에) 의해'를 (...에) 따라'로 다듬은 사례다. 이 경우는 아주 드물게 원어는 없다.
이처럼 방대한 '다듬은 말'을 한 곳에 모아 놓은 검색창을 운영하는 이유는 뭘까. 그만큼 외래어와 외국어를 쓰는 사례가 너무나 많다는 점을 곧바로 알 수 있다.
이와 관련, 경상국립대학교 국어문화원 소식지는 왜 우리 주변에서 외래어와 외국어를 많이 쓰는 사람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는지, 문제제기를 한다.
소식지는 국립국어원 조사 결과를 인용, "일상생활에서 외래어나 외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 '잘난 척하는 느낌이 든다'는 응답이 21.4%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다시 말해, 외래어나 외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 다섯 명 중 한 명은 잘난 척하는 느낌을 받는 것이다.
이런 조사는 뭘 의미하는가. 소식지는 "외래어나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인식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며 "나아가 공문서에 외래어나 외국어를 많이 사용하면 국민 간에 정보 격차가 생길 뿐만 아니라, 국민과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한다.
이어 "외국어와 외국어를 많이 사용하면 국민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없다"며 "외국어와 외래어는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한 바, 다듬은 말(순화어)을 우선으로 하여 사용하고, 순화어가 없다면 가능한 한 쉽고 바른 우리말로 바꾸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음은 소식지에서 소개한 '공문서에 자주 사용하는 외래어·외국어와 다듬은 말'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