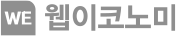![[사진=뉴시스]](/data/photos/201811/20181126150948010279d488cea5c121131233211.jpg)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대우건설이 현장 전문직이라는 이름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막는 ‘편법 쪼개기 계약’을 일삼다 적발돼 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경향신문은 대우건설이 지난 2007년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시공·품질·안전관리 업무를 하는 계약직 노동자들이 현장을 옮길 때마다 한 달이나 보름 정도 시차를 두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해왔다고 보도했다.
쪼개기 계약은 비정규직 사용기한이 2년을 넘을 경우 정규직 전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와 2~11개월 등의 형태로 단기 계약을 맺는 행태를 말한다.
보도에 따르면 대우건설의 현장 계약직들은 실제로 현장 이동 후 계속 일했지만 본사 인사팀의 지시로 형식상 15~30일 정도 고용을 단절시킨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했다. 또 대우건설이 계약서 없이 일을 시키는 동안 이들의 임금은 현장소장 지시로 비자금을 만드는데 활용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대우건설의 이 같은 반복적인 쪼개기 계약에 따라 비정규직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자만 3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은 현장 전문직(계약직) 모집공고를 올리고, 서류심사 등 3단계에 걸쳐 청년 구직자들은 선발했다. 하지만 이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는 없었다. 전문직은 종전 현장에 반드시 사직서를 내고 새 현장에 배치된 후에는 15~30일 정도 공백을 두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식으로 철저히 관리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대우건설에서 20여년간 근무하며 현장 인력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윤모 전(前) 차장은 “수원 광교 현장에서도 9명의 비정규직이 다른 현장에서 전출돼왔는데 본사 인사팀에 ‘바로 계약서 써도 됩니까’라고 물으면 항상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지시가 내려왔다”며 구체적인 정황을 설명했다.
윤 전 차장의 제보로 서울노동청은 5개 현장에 대한 예비감독을 거쳐 이달 초 대우건설 본사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윤 전 차장의 제보 내용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실제 한 전문직 사원은 20대 후반 대우건설에 입사해 2008년 5월 동탄 푸르지오, 2008년 11월 동탄 오피스텔, 2009년 3월 서울 중구 다동 오피스텔, 2011년 9월 차병원연구소, 2014년 1월 수원 광교 월드마크 현장 등 10년 가까이 5개 현장을 돌아다녔지만 비정규직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서울노동청은 지난 7월 특별근로감독 접수 후 4개월이 넘게 조사한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